내 이름은 만세, 고양이다.
친구여, 오늘 하루도 무사했는지… 비가 내릴 것만 같은 밤이면 네가 꼭 생각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더라. 온화한 바람이 거세고 길었던 어떤 계절을 조금씩 밀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마도 두 해 전 봄이었던 것 같다. 온통 회갈색이던 풀숲에 조금씩 초록의 기운이 돋아나던 나날 중 어느 날이었을 거야. 그때 내가 살던 집 창밖에서 들려왔던 여린 풀잎 같던 아기 고양이 소리,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고 기억해.

신소윤 기자
우리 집 뒤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잡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어. 그런 안전한 곳을 네 엄마는 영리하게도 찾아냈고, 그해 봄 그곳에서 몸을 풀었단다. 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털옷을 입은 네 엄마는 두 마리 고양이를 품고 있었다. 엄마를 똑 닮은 너와 검은색 털에 발과 얼굴 일부만 흰 털을 가진 네 형제. 인간들은 고양이의 이런 털 무늬를 보고 ‘고등어’ ‘턱시도 고양이’라는 별명을 붙이곤 하더라.
나는 평소에도 공터가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새 소리, 풀 소리를 듣곤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고양이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약간 흥분되는 뉴스였어. 집주인은 몸을 푼 네 엄마를 위해 내 사료통에서 먹을 것을 한 줌씩 가져다 너네가 드나드는 통로에 놓아두곤 했어. 뚱냥이인 나도 물론 기꺼이 양보했단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너네도 엄마에게 사냥을 배워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했나봐. 드문드문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렇게 나는 네 소식을 궁금해하다 잠깐 잊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단다.
그리고 이듬해 봄, 나는 같은 곳에서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었다. 네 엄마는 자기와 많이 닮은 너에게 영역을 물려주고 다른 곳으로 떠난 모양이었고 1년 사이 훌쩍 큰 너는 고양이 네 마리의 엄마가 되어 있더구나. 우리는 한 해 전 봄처럼 매일같이 오늘도 어제처럼 무사한지 창밖을 내다보았어. 네 마리 중에서도 몸이 유독 날랜 애가 있는가 하면 옹골차게 먹는 애가 있던데 그런 녀석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커지더구나. 밤새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에는 아기들의 안녕이 염려됐는데 결국 다른 놈들보다 유독 작고 약해 보이던 한 마리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네 눈을 한참 들여다보며 위로를 전했는데 네 마음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퍼졌을지 모르겠다.
밤산책을 하고 돌아온 제리 형님이 종종 네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 골목을 샅샅이 훑어봐야 입에 물고 들어갈 것이 별로 없는 이 도시에서 빈손으로 종종거리는 네 뒷모습을 보았다고 제리 형님이 알려주곤 했단다.
집고양이의 평균수명은 길고양이보다 네댓 배나 길어. 나는 길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도통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나날일 거라고 겨우 생각한단다. 주말에 청소를 할 때면 집주인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곤 했는데, 그때 나는 네가 사는 공터에 훌쩍 내려가볼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았단다. 고양이가 인간들의 집에 깃들면서 가지게 된 습성은 세상 가장 안온한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야생의 삶을 포기한 대신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단다. 네가 활보하는 영역에 비하면 내가 가진 공간은 옹졸하기 그지없지만 푹신한 소파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곳이 주는 안정감을 나는 포기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공터가 내려다보이던 그 집에서 아주 멀리 이사를 와버렸고, 지금은 이 동네 길고양이 소식을 도통 들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길고양이 친구인 네 소식이 가끔 아주 궁금해. 지난해 겨울은 잘 넘겼을지, 누군가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주긴 하는지, 올봄에 또 몸을 풀지는 않았을지. 힘세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곳에 있어주렴.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자두농사 청년’ 향년 29…귀촌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입틀막’ 대통령경호처, 총선 직후 1억원 ‘과학경호’ 행사 취소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도와달라”…낙선 의원들 격려 오찬

‘1인 가구 10평 원룸’ 살아라?…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물러선 국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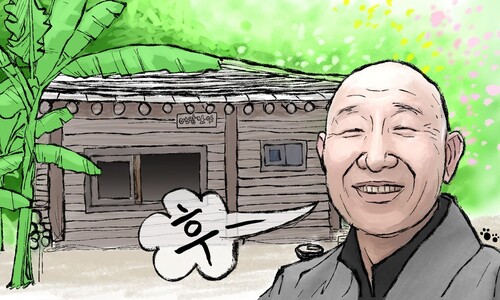
5평 토굴의 스님 “편하다, 불편 오래되니 ‘불’ 자가 떨어져 버렸다”

민희진, 1년 전 “어도어는 내 음악·사업 위한 회사” 인터뷰 재조명
![[현장] 미 대학가 텐트 농성…“가자 고통에 비하면 체포가 대수냐” [현장] 미 대학가 텐트 농성…“가자 고통에 비하면 체포가 대수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4/53_17139401488024_20240424502126.jpg)
[현장] 미 대학가 텐트 농성…“가자 고통에 비하면 체포가 대수냐”

집값 빼고도 6298만원…‘웨딩플레이션’ 허리 휘는 예비부부

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야당 “악수하자며 따귀 때려”

양조장 직원, 음주단속 걸렸지만 무죄…이유가 놀랍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