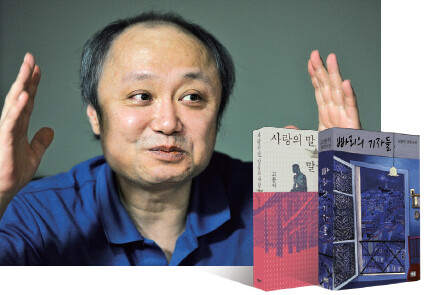
한겨레 강재훈
“사랑은 어루만진다. 사랑은 할퀸다. 상처를 내는 것도 사랑이고, 상처를 아물리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은 약이면서 독이다. 사랑은 두 사람의 코뮤니즘이다. 그것이 때로 독일지라도, 덧없는 상호구속적 코뮤니즘일지라도,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정열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알마 펴냄)의 개정판을 펴낸 작가 고종석(56·사진)의 말처럼, 사랑이 행복이면서 불행이라는 것을, 기쁨이면서 슬픔이라는 것을 서른 중반에야 알았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라도 없다면, 그(녀)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가난할 것인가.
1996년 봄, 서른여섯 살의 ‘에뜨랑제’가 파리에서 여드레 만에 쓴 이 책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식인이 자신만의 사전을 펴내는 일이 드문 한국에서, 모국어로 이뤄진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줄곧 분만해내던 스타일리스트의 ‘사랑어 사전’은, 해박한 언어학적 지식과 탁월한 시적 감수성으로 한국어에 대한 그의 ‘도타운 사랑’을 뽐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은 한국어에 대한 지성과 사랑에 대한 감성이 서로 ‘입맞춤’하여 낳은 ‘매초롬한’ 문장으로 꼽을 만하다. “그립다는 그리다의 내적 침잠이다. 그리고 그리워하다의 고치이다. 그리움은 결핍으로서의 사랑이다. (…) ‘사랑이 와서, 우리들 삶 속으로 사랑이 와서, 그리움이 되었다.’”(그리움)
그렇다고 이 산문이 애틋한 낭만적 사랑의 단어만을 목록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발가벗고 서로 껴안는 것은 사랑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껴안다)인 까닭에 사랑의 말들은 대개 성애(性愛)의 말들이다. “몸이 있는 탓에 이렇게 너와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몸이 없다면 어떻게 널 만져볼 수라도 있을까?”(몸1) “몸을 지닌 것들의 특권.”(발가벗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다. 놀아나다라는 말과 함께 연애의 본질을 명쾌하게 꿰뚫고 있다. 연애는 유희이고 접촉이다.”(붙어먹다) “정열의 시발역이고 종착역. 사랑의 말들은 살의 말들이다. 여자가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살을 섞는다는 것이다.”(살) “옷과 가슴 사이에 난 틈. 텅 빔. 관능의 늪. 관음觀淫의 표적. 관음觀音의 적敵.”(살품) 같은 예들은 관념적 사랑에 종지부를 찍으며 헌걸차게 성적 분방함을 지지하는 저자의 애정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 사랑은 정사(情事) 너머의 정념(情念)임을 그가 어찌 모르랴. “내 정인情人의 마음자리”(살갑다), “사랑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행위이지만, 자주, 더 큰 외로움을 낳는다”(외로움), “모든 그리움의, 그러므로 모든 사랑의 밑감정”(애틋하다) 같은 문장들은 그래서 더 애잔하다.
언어학과 문학의 처음 이루는 초기작가 사랑과 한국어에 대한 직관적 통찰로 ‘흐드러진’다면, 21년 만에 재출간된 그의 첫 책 (새움 펴냄)은 이국적 사랑과 유럽사에 대한 지적인 대화로 ‘싱그럽다’. 기자 시절의 파리 연수를 줄기 삼아 쓰인 이 소설은, 유럽을 무대로 펼쳐지는 기자들의 삶과 그 마감의 강에서 만난 두 남녀의 사랑으로 읽는 이를 ‘설레게’ 한다. 그리고 그 설렘은 연대와 참여라는 유럽적 가치와 버무려져 세계시민주의로 ‘무르녹는다’.
그의 언어학과 문학의 처음을 이루는 초기작 두 권을 다시 뒤적이고 있자니, 이제야 알겠다. 내 누추한 문체는 그의 화사한 문장의 각주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은 생각하지 마’…한동훈 총선 메시지가 ‘폭망’한 이유

윤,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홍세화의 마지막 인사 “쓸쓸했지만 이젠 자유롭습니다”

조국 “윤 대통령, 내가 제안한 만남도 수용하길”

봄 맞아 물오른 버드나무 40그루 벤 뒤…5만평 모래톱 쑥대밭으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날짜·형식 정해지지 않았다”

‘죽은 듯 드러누운’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에 체포됐다

‘제4 이동통신’ 드디어 출범…“가입자를 ‘호갱’에서 해방시킬 것”
![동물이 사라진 세상, 인간이 고기가 돼 식탁에 [책&생각] 동물이 사라진 세상, 인간이 고기가 돼 식탁에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4/0418/20240418503972.jpg)
동물이 사라진 세상, 인간이 고기가 돼 식탁에 [책&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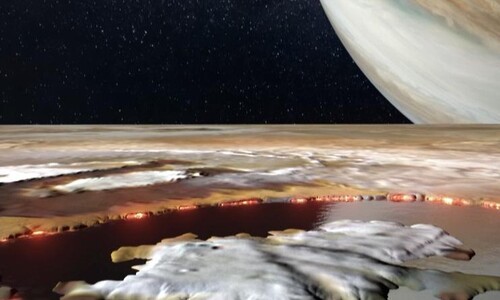
‘불의 천체’ 이오에는 폭 200km 용암 호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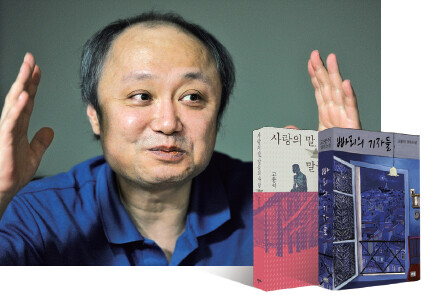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