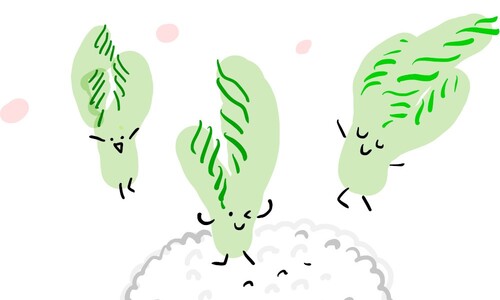내 이름은 만세. 고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냐, 내가 집주인 대신 까만 밤 멀리 별처럼 총총 떠 있는 간판 불빛을 등불 삼아 원고를 쓰고 앉아 있는 것이. 앞발로는 부지런히 타이핑을 치고 있으므로 뒷발가락 8개를 하나둘 꼽으며 헤아려본다. 일곱, 그래 일곱 번째 만에 나에게도 찾아오고야 만 것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그것, 발등에 떨어지는 불, 마감병이라는 것이.

신소윤
이것은 마감이라는 숙명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노동자라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불치의 병. 변수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그러나 대체로 악화일로를 걷는 무서운 병. 증상은 이렇다. 1단계, 대개 불안하다. 보통 마감 3일 전쯤까지는 세상에 마감이란 없는 것처럼 지내다 디데이를 3일만 앞두면 누군가 심장을 바꿔 끼워놓은 것처럼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아, 이제 슬슬 써야겠는데. 어떡하지? 머릿속으로만 여러 번 원고를 썼다 지웠다 반복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 첫 번째 불안이 찾아왔을 때는 속으로 ‘어떡하지’만 거듭하다가 하루가 끝난다. 마감 없는 하루의 마감.
2단계, 잘돼가고 있지? 누군가 묻는다. 무어라고 말해야 하나. 아, 망했어요, 아니면 걱정 붙들어매쇼? 망하기에는 아직 제대로 쓴 것이 없고, 걱정 말라고 하기에도 역시 제대로 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감 노동자는 늘 마감을 앞두고 뻥쟁이가 되어간다.
3단계, 어쨌거나 시간은 흐르고 마감 전날 밤은 깊고 처절하게 찾아온다. 엄숙한 노동의 현장이 펼쳐진다. 마감은 왜 늘 밤에만 이뤄지는가. 마감 노동자들은 고양이처럼 모두들 야행성 동물인가. 그래서 집주인이 나에게 마감의 굴레를 뒤집어씌운 것인가. 그러나 노동의 장이 펼쳐졌다고 해도 당장 마법같이 마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약하게 꼬인 등산로를 오르듯 천천히, 끈질기게 고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길을 걷노라면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냥 다시 내려가서 더 쉬운 길을 찾아볼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간식이나 까먹으며 생각해보자. 그렇게 야식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애연가라면 끝없이 베란다와 방 사이를 오갔겠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형님도 마감 중이었던 것이구나. 어렵사리 키보드 위에 손을 얹는다고 해도 마감은 멀고도 먼 곳에. 애먼 사이트에 접속하기 시작한다. 창을 내지 못해 한 맺힌 것처럼 끝없이 인터넷 창을 열어젖힌다. 쇼핑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집을 산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도, 사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마감 이후로 미뤄두고 열어둔 인터넷 창은 닫지 않은 채 다시 커서가 깜박이는 하얀 창으로 돌아오면, 현실 속 시커먼 창에도 흰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래 이건 목욕 수준의 재난이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나는 이미 물에 젖어버렸으므로 이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 문장을 향해 달려가 마침표를 찍어야만 끝나는. 오늘도 날밤과 함께 털이 하얗게 새버렸네. 원래 하얗다보니 뭐 이건 티도 안 나고. 억울하다옹.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인적 쇄신 막는 ‘윤의 불통’…‘김건희 라인’ 비선 논란만 키웠다

이화영 “이재명 엮으려고”…검찰 ‘술판 진술조작’ 논란 일파만파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8/53_17134316400177_20240418503354.jpg)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의대 증원분 절반 모집’도 허용해달라는 대학들…정부 받아들일까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9/17134778819525_20240418503993.jpg)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

멤버십 58% 올린 쿠팡, 해지 방어에 쩔쩔

22대 국회 기선제압 나선 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

‘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별세…마지막 당부 ‘성장에서 성숙으로’

평생 자유 향한 고뇌…진영 넘어선 영원한 비판적 지식인

“15살 이하는 영원히 담배 못 사”…영국, 세계 최강 금연법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