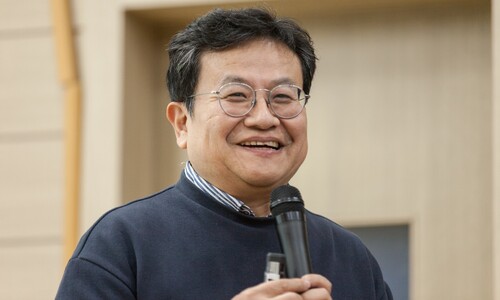내 이름은 만세. 고양이다.
나는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 요즘 꽤 마음에 드는 낮잠 장소를 찾았다. 여기는 아기 침대, 창가에 놓여 햇살도 따뜻하게 들어오는데다 낮에는 모두들 거실에 나가 있으니 전쟁통 같은 인간들의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두둑이 사료를 먹고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게 이런 거지. 내가 소파며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여기가 명당이지, 하며 은근슬쩍 엉덩이를 들이미는 주인도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등짝을 마구 지지며 숙면의 세계로 슬금슬금 넘어가려는데….

신소윤
갑자기 얼굴이 쌀떡처럼 하얗고 통실통실한 인간이 눈앞에 두둥실 나타나더니 말한다. “다음 계약 때는 전세금을 올려주셔야겠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이 공간은 당신이 자주 비워두니 앞으로 쭉 조건 없이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앉은 이는 짧고 통통한 손을 흔들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곧 근처에 지하철도 들어오고요, 뒤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보이죠? 신문 안 봐요? 이 동네가 요즘 전세가 상승률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그때고, 좋은 조건에 들어왔으니 다음에는….” 들은 척 않고 엉덩이에 힘을 팍 주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 그 인간이 두 손으로 내 엉덩이를 꽉 쥐고 흔들기 시작한다. “나와, 나오라고.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면 다야?!!”
집 없는 설움에 나오는 콧물을 훔치며 눈을 뜨니 아, 꿈이었구나. 내 엉덩이를 쥐고 흔들던 인간은 다름 아닌 집주인의 아기였구나. 지 침대에 좀 누웠다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기냐.
요즘 남의 침대에 짱박혀 있다보면 그래도 나도 아기처럼, 제리 형님처럼 싫으나 좋으나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꿈을 꿨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집에서 자기 공간이 없기로는 나밖에 없다. 고양이야말로 영역의 동물인데. 제리 형은 반려견 키우는 집이라면 하나씩 다 있다는 강아지용 국민 방석이 제 집이다. 푹신하고 아늑해서 개들이 꿀잠을 잔다고 ‘떡실신방석’이라는 별명도 있는 거기에 형 몰래 슬그머니 누워봤더니 아, 형은 좋겠다. 나보다 짬밥이 적은 아기는 땅따먹기 하듯 이 집에서 제 영역을 넓혀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렇게 나의 내 집 마련 투쟁은 시작된 거다. 나도 이건 만세 집이다, 하는 걸 갖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 나는 주인 보랍시고 주인이 바닥에 내팽개쳐둔 가방 속에도 들어가고, 풀어헤쳐놓은 택배상자에도 들어가고, 비닐봉지에도 몸을 구겨넣고…. 주인은 이렇게 방랑생활을 하는 내 맘도 모르고 별 데에 다 들어간다며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고.
그나저나 고양이가 웬 꿈이냐고? 고양이도 꿈을 꾼다. 하루 16시간 잠을 자는 고양이는 그 가운데 3시간을 떼어 꿈을 꾸는 데 쓴다고 한다. 하루 2시간 정도 꿈을 꾸는 인간보다 더 오래다. 를 쓴 데틀레프 블룸은 프랑스 작가 장 루이의 말을 빌려 “3시간 동안의 꿈으로 (고양이가)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물고기와 파충류는 꿈을 꾸지 않고, 새들은 하루에 1분 남짓 꿈을 꾼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보다 위대한 고양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다 꿈을 꾼 그런 이야기. 음냐음냐, 음냐옹.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진성준 “윤, ‘망나니 칼춤’ 류희림 해촉하고 언론탄압 사과해야”

나는 시골 ‘보따리상 의사’…평범한 의사가 여기까지 오려면

미 국무 부장관 “윤 대통령·기시다 놀라운 결단…노벨평화상 자격”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하이브,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 ‘빈껍데기 만들자’ 모의”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 혐의로 물러날까…“사퇴 고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